기자정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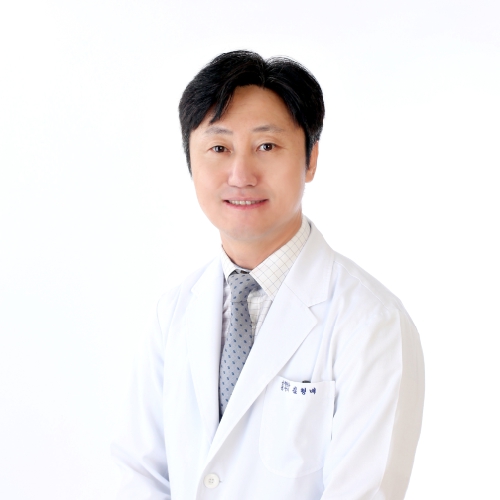
작성한 뉴스
-
헬시라이프 꽃은 폈는데 마음은 한겨울…‘봄 타는 느낌’, 왜 드는 걸까? 2024.04.03 안세진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봄이 되면 겨울에 비해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꽃이 화사하게 피어나면서 가슴이 설레는 이들이 있다. 반면 오히려 봄이 되면서 더욱 울적해지고, 가라앉는 듯한 기분을 느끼는 이들도 있다. 이를 두고 흔히 ‘봄을 탄다’고 표현하는데, 왜 이런 기분이 드는 것인지 알아보자.봄만 되면 더 우울한 느낌, ‘계절성 우울증’ 주의봄만 되면 기분이 우울하게 가라앉거나 허무하고 답답한 느낌이 드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전형적인 ‘계절성 우울증(계절성 정동장애)’의 한 증상이다. 일반적인 우울증과는 달리 특정 계절에만 감정 기복이 생기는 경우를

-
헬시라이프 왜 청년들의 기억력은 점점 퇴보하는가 ⑤ 영츠하이머 예방 2021.12.17 성진규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일반적으로 노인 질환으로 알려진 치매. 하지만 현대사회에서 치매는 더 이상 노인 질환에 국한되지 않는다. 최근 들어 많은 2030세대 젊은이들이 잦은 건망증과 기억력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잡코리아가 알바몬과 함께 성인남녀 649명을 대상으로 한 건망증 관련 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43.9%가 스스로를 영츠하이머(젊음(Young)과 알츠하이머(Alzheimer)를 합친 신조어)’라고 응답했다.대한민국을 이끌어갈 2030세대를 위협하는 영츠하이머는 일시적인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건망증이 반복되면 뇌 기능을 떨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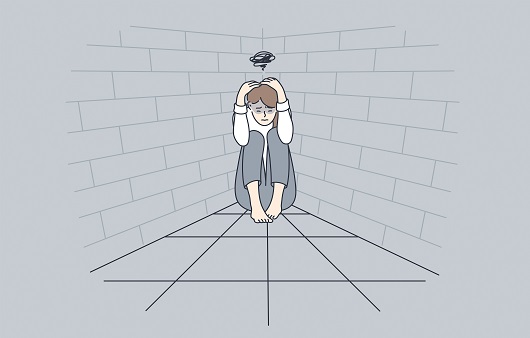
-
헬시라이프 왜 청년들의 기억력은 점점 퇴보하는가 ④ 사회적 현상인가? 2021.12.16 성진규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몇 년 전 영츠하이머라는 신조어가 처음 등장한 후 많은 이들의 공감을 받은 것은 그만큼 비슷한 문제를 경험한 분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회현상은 나 혼자만 겪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많은 이들이 겪는 현상, 비슷한 환경에서 살아갈 때 겪는 동일한 문제를 의미합니다.특히 어린 시절부터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어 매우 익숙해져 있는 2030세대는 영츠하이머에 취약한 세대입니다. 게다가 실업, 빈곤, 차별, 경쟁, 불통 등의 시대 과제 속에서 2030세대는 끊임없는 도전에 직면해있으며, 회복의 희망을 기다리며 버티지만 언젠가

-
헬시라이프 왜 청년들의 기억력은 점점 퇴보하는가 ③ 술 2021.12.15 성진규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대한민국 사람들은 술을 꽤나 사랑한다. 어느 모임에 가던지 술자리가 잘 빠지지 않으며, 각종 드라마 등 미디어에서도 술은 빠지지 않는 요소이다.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술과 건강에 대한 국제 현황 보고서 2018’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2015~2017년 연평균 1인당 알코올 섭취량이 10.2L로 일본(8L)과 중국(7.2L)을 제치고 동북아 아시아 최고의 주당 국가로 등극했다. 또한, 대학내일20대연구소에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2030세대 남녀들이 한 달에 술값으로

-
헬시라이프 왜 청년들의 기억력은 점점 퇴보하는가 ② 사회적 스트레스 2021.12.14 성진규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현대의 대한민국은 높은 실업률과 높은 청년 자살률, 그리고 낮은 혼인·출산율 등 젊은 청년층이 살아남기 힘든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해가 지날수록 청년들의 자살률은 높아져만 가고 있다. 지난 9월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고령층을 중심으로 40대 이상에서는 자살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미래를 책임질 10~30대의 자살률은 높지는 추세다. 점점 대한민국 사회가 청년들의 정신건강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다.문제는 이렇게 치솟는 자살률과 함께 청년들의 인지 기능에도 비상벨이 울린

-
헬시라이프 왜 청년들의 기억력은 점점 퇴보하는가 ① 디지털치매 2021.12.13 성진규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2004년에 개봉한 '내 머릿속의 지우개'라는 영화가 있다. 20대라는 젊은 나이에 알츠하이머병에 걸린 여자에 관한 이야기다. 로맨스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기억을 잃지 않으려 병마와 처절하게 싸우는 수진과, 그녀의 기억과 행복을 지켜주려는 철수의 노력이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일반적으로 알츠하이머병같이 기억력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인지 기능의 퇴화는 주로 중년과 노년층에게서 보이는 현상이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 들어서 영화 속 젊은 수진와 같은 알츠하이머병은 아니지만 젊은 나이에 건망증을 호소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

-
헬시라이프 명품에 빠진 ‘물질만능주의’...과연 행복할까? 2021.12.07 성진규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각자의 답변을 가지고 있겠지만, 한국인의 경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재화’다. 지난 11월 미국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Pew Research) 센터가 주요 17개국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 설문 조사에 따르면, 17개국 평균 결과에서 가족(28%)이 1위에 뽑힌 반면 한국인 응답자들만 물질적 행복(mat0erial well-being)을 1순위(19%)로 꼽았다. 또한, 올해 6월 시장조사기업 칸타의 ‘칸타 글로벌 모니터 20

-
헬시라이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말하는 '2030세대'의 정신건강....높아지는 청년 자살률 ③ 2021.10.14 성진규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대한민국 2030세대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높은 청년 실업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한 끊임없는 경쟁,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청년 자살률은 점점 높아져만 가고 있다.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전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수준이다. 문제는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10~30대의 사망원인 1위 역시 자살이라는 것이다. 통계청의 조사에 따르면 2019년에만 13,799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이 수치는 하루 평균 37.8명이나 된다. 그중 자살로 인한 10~30대의 사망은 10대는 37.5%, 20대는 51%, 30대는 39%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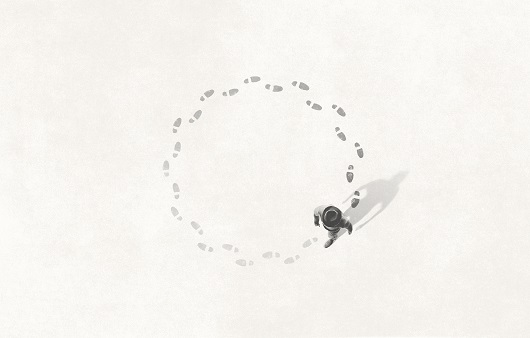
-
헬시라이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말하는 ‘2030세대’를 더 힘들게 만드는 것 ② 2021.10.13 성진규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대한민국 청년들은 실업률뿐만 아니라, 외로움과도 싸우고 있다.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할 나이에 혼자서 생계유지를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학업과 취업 준비 등으로 인해 사회와 단절된 삶을 사는 일명 ‘고독생’을 살고 있다.문제는 사회와 단절된 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청년들이 감정을 풀 곳도, 기댈 곳도 없기 때문에 쉽게 우울증과 같은 질환에 취약해진다. 이와 같은 이유로, 안타깝게도 점점 청년들의 고독사도 많아지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발생했던 고독사 790건 중에 30대 이하의 고독사가 73건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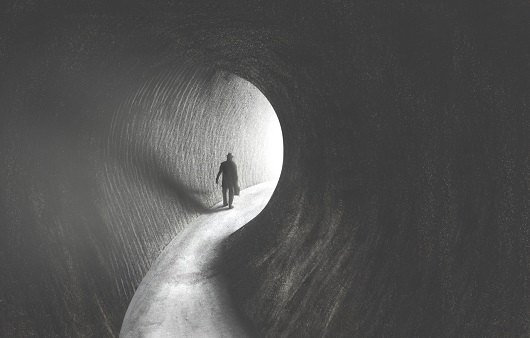
-
헬시라이프 정신건강전문의가 말하는 '청년 실업률’과 ‘2030세대 정신건강’① 2021.10.12 성진규 하이닥 건강의학기자
청년 실업률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올해 청년실업자가 41만명을 돌파했다. 또한, 청년실업률은 1년 전보다 상승해 10%를 달성했으며 청년 체감실업률은 26%를 웃돈다. 청년들 4명 중 1명은 실업자라는 말이다. 심지어 구직을 단념한 청년들의 숫자가 22만명을 넘어섰다.하지만, 여전히 청년실업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률은 세계적인 추세와 달리 꾸준히 증가했는데, 2009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의 대졸 실업률은 OECD 전체 국가 14위에서 28위로 14단계나 하락

